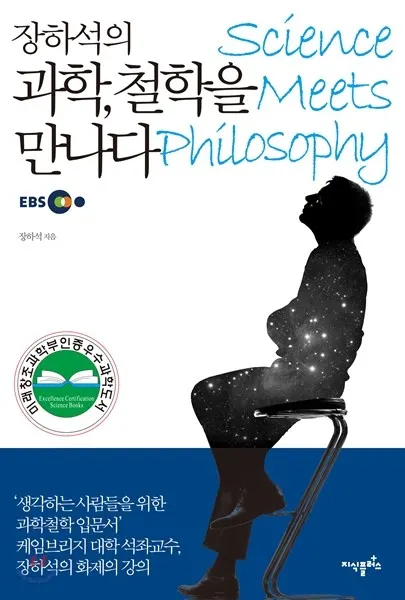과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준다. 그런데 과학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지? 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시도하는 일 부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시험에 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다보면, 결국 "어떻게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어른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교사들은 어떻게든 숨기려 했다. 나아가 학교에서는 마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알아낸 것 처럼 얘기했다. 나는 중학교에 들어갈 때 까지, 이제 자연의 모든 신비는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탐험가나 과학자 같은 건 필요 없는 줄 알았다. 과학적 지식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에 의문을 품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 배신감이 사람에 따라서는 과학에 대한 냉소나 반지성주의로 이어지기도 하는 듯 보인다.
『과학, 철학을 만나다』 는 "과학자들이 무엇을 알아냈는가"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물은 1기압 아래에서 100도에서 끓는다"는 지식을 보자. 엄밀히 말하면, "물이 어는 점을 0도로 하고 끓는 점을 100도로 하는 온도 단위계"가 섭씨이므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알아낸" 지식의 범주에조차 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말 조차도, "순수한 물은, 기압만 같으면 늘 같은 온도에서 끓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물을 다른 그릇에서 끓여도 늘 같은 온도에서 끓을까? 전세계의 모든 그릇에서 물을 끓어보지도 않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의 확신이 정당하기는 할까?
사실 이는 인식론 입문서에서 흔히 제기하는 물음이다. "여태까지 관찰된 999마리의 백조는 희다. 따라서 1000번째의 백조도 흴 것이다"라는 귀납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칸트등의 근대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해설하는 교양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교양서들 대부분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칸트 등의 근대철학자"들이 사용한 예시와 설명을 그대로 재활용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대의 한국인이 읽었을 때 "뜬구름 잡는", "와 닿지 않는" 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 철학을 만나다 』가 탁월한 점은, 이런 고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제기하고 또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저는 옥토끼가 달나라에서 떡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자랐지만, 도대체 웬 토끼가 달에 있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전설이겠거니 하고 무시해버렸고 그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커서 미국에 유학까지 간 이후 어느 날 보름달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토끼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 후로는 서양사람들에게 토끼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알아보고 재미있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봐도 도저히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달나라 토끼가 과학적 관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6세기 이전 유럽의 천문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내려온 이론에 따라 모든 천체, 그러니까 달을 비롯한 모든 행성은 완벽한 구형이고, 그러므로 표면에 들쑥날쑥한 흠집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나 17세기 초반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달을 본 갈릴레오는 그 표면에 산도 있고 분화구나 바다처럼 생긴 부분도 있는 등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략) 갈릴레오는 이러한 달 관측 결과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맞서는 무기로 썼는데 그 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를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과학을 싫어한다. 과학을 왜 배우는지도, 그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그 지식이 타당하기는 한 지 조차도 알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과학을 배웠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과학, 철학을 만나다 』는 그런 경험을 한 모든 이들에게, 과학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과로 도출된 지식보다 그 지식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과정이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헛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최선의 지식인지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설명한다. 특히 PART2부터는 실제 과학 실험을 통해 "과학 활동"의 맛보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과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조차도 흐릿하게 기억나는 사람들 조차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다. 예를 들어 "물을 끓이는 실험"은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지식만 있어도 누구나 따라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나아가 폭력적으로 과학을 배운 경험 때문에 과학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기를 바란다.